〔칼럼〕경자유전의 농지법 개정이 절실하다

본문
(농축투데이) 헌법 121조 1항에 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한다. 그리고 2항에는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1987년 헌법에 명시됐다. 1996년 1월 1일 농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 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 2003년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주말농장’ 제도가 도입되어 도시인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대에 1000m2(300평) 미만의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는 100명당 14세 미만의 유소년층 14명, 64세 미만이 55명, 65세 노인이 4명이었다. 도시 37명, 촌락 63명으로 농업국가였다. 2020년대 여자 50명, 남자 50명으로 유소년층 12명, 청장년층 72명, 노년층 16명, 도시 91명, 촌락 9명으로 변했다. 내년엔 우리나라 인구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1960년대 인구밀도는 서부 평야 지대가 높았다. 2020년 인구밀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높아졌다. 정부 당국은 헌법 121조에 근거를 둔 경자유전의 농지법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자경농민에게 직불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농지법 개정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100명당 도시 인구가 91명이고 촌락인구가 9명인 현실에서 볼 때 이대로 두면 농촌의 발전은커녕 황폐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시인도 법이 정한 한도에서 농토를 보유할 수 있고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만 한다. 문중에서 소유한 시향 답이나 전은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로 문중으로 재산 등기 이전되어서 보존해야만 한다. 시향 전답 등 문중 재산을 종친 중 몇 사람이나 개인의 명의로 등기되면 근저당이나 매도, 증여, 상속되는 병폐가 생기는 일이 십상이다. 그런 병폐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에서는 헌법 121조에 의한 경자유전의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특례조항이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문중 재산으로 등기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한다. 63% 농촌인구였던 농업국가에서 촌락인구가 9%, 도시 인구가 91%인 시대의 변천에 따라 도시인도 영농할 의사가 있다면 농지법 개정으로 토지를 소유할 길을 열어주어야만 한다. 더불어서 농지법 개정으로 문중 재산인 시향 전답이 문중 회의를 통한 의결로 문중 재산으로 등기 이전이 절실하다.
-약 력-
-2004년 장편소설 ‘질경이꽃 피는 날’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소설가)
-2018년 자전 장편 대하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 6권 저자(도서 출판 항암)
-現 한국문인협회 회원(소설 분과), 인천광역시 문인협회 회원(소설 분과),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한국문학예술 저작권협회 회원
출처 : 농축투데이(https://www.nongchuktoda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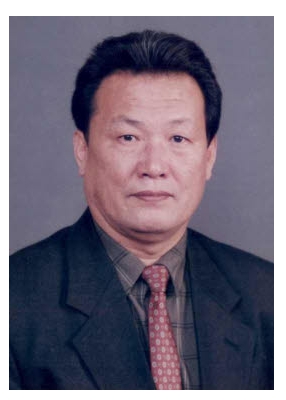
정항암(덕수 56회)

댓글목록0